명상 수행

붓다
1. 석가(釋迦)
석가모니란 [샤카]족 출신의 성자(聖者)란 뜻이다. 즉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북부 가비라성(Kapila-vastu)의 별장인 룸비니 동산에서 왕자로 태어나 29세까지 태
자로 생활하다 출가하여 6년간 갖은 고행을 거쳐 인도 중부 나이란자나(Nairanjana)
강변에 있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성도한 고마타 싯달타(Gautama-Siddhaltha)
가 곧 석가모니인 것이다. 그 후 석가모니는 많은 신자를 모으고 45년 동안 설법한
뒤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게 된다. 당시 인도의 풍습에 따라 석가모니의 유해는 화
장(茶昆)되는데, 화장 후 많은 제자와 신자들은 앞다투어 그 유골을 나누어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손수 매장하여 그 무덤을 예배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유골
을 사리(私利, Sarira)라하여 특히 신성시 하고 그 무덤을 솔탑파(率塔婆, Stupa), 줄
여서 탑파라고 불렀다. 이 탑파의 표면은 온갖 조각으로 장엄되는데 이러한 탑 장엄
에서부터 불교미술이 꽃피게 되었다. 불법을 지키는 여러 신의 모습에서부터 석가모
니의 전생(前生)의 이야기(본생담(本生譚)),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석가모니의 일대
기(불전도(佛傳圖)), 연꽃이나 당초무늬 등의 장식문양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탑 장엄에서는 주인공인 석가모니의 모습은 절대로 표현되지 않고 수레바퀴(
법륜(法輪))나 대좌,불족(佛足), 보리수와 같은 상징물로 대체되는 점이 특징이다. 석
가모니의 입멸 후 그의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편집하였으며, 그의 가
르침을 따르는 승단(僧團)과 불교를 중흥시킨 아쇼카왕과 카니시카왕에 의해 불교는
종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여 서기 1세기 무렵 대승불교의 성립을 보게 되었
다.
이때부터 석가모니는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되어 성불(成佛)하기 전의 모습을 한
보살상과 성불한 여래상 등 두 형식의 예배상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다. 먼저 여
래상에서는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외인(施無畏印)과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준
다는 여원인(與願印)의 수인을 한 입상이 만들어 졌으며, 이어 보드가야에서 성도 순
간을 표현한 선정인(禪定印)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그리고 처음 설법할 때의 모
습인 초전법륜인(初轉法輪印)의 수인을 맺은 좌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초기 불탑에 흔히 조각되는 본생담이나 불전도가 표현된 예는 찾을 수 없다. 단
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불전도를 압축한 팔상도(八相圖)가 종종 그림으로 표
현되고, 이 장면 속의 석가모니상이 독립된 조각으로 널리 형상화 되었다. 팔상은 도
솔에서 내려오는 상(도솔래의상(兜率來儀像)), 룸비니동산에 내려오는 상(비람융생상
(毘藍隆生相)), 4문에 나가 관찰하는 상(서문유관상(西門遊觀相), 성을 넘어 출가하는
상(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설산에서 수도하는 상(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상(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포교하
는 상(녹원전법륜상(鹿圓轉法輪相)),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하는 상(쌍림열반상(雙林
涅槃相)) 등이다. 이들 상들은 이미 불상의 자세와 수인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가운
데 탄생불은 룸비니동산에서 어머니 마야(摩耶)부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태어나자마
자 7걸음을 걸으면서「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치며 자신의
절대성을 강조했다고 하는 탄생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흔히 상체는 나신에 아
랫도리에 짧은 치마를 걸친 직립의 모습에, 한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늘어뜨려 땅을 가르키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2.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Vairocana)은 태양의 빛처럼 불교의 진리가 우주 가득히 비
추이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부처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설법하지 않는 점이 특
징이다. 불교의 진리, 곧 불법(佛法) 그 자체를 상징하는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불상
으로서 형상화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속한다. 비로자나불의 모습은 처음에 중
국에서 노사나불(盧舍那佛)로서 그 도상이 불완전하게 시도되다가 밀교(密敎)에 수용
되어 대일여래(大日如來)로 불리면서 표현 형식이 확립되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는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비로자나불의 조성이 성행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비로자
나불의 모습은 일본 밀교의 금강계만다라(金剛系曼茶羅)의 주불인 보살 모습에 지권
인(智拳印)의 수인을 맺은 형식과, 태장계(胎藏系) 만다라의 주불인 법계정인(法界定
印)을 맺는 두 가지 형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754년에 제작된
신라 화엄경변상도(華嚴經變相圖)가 보살형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최초예로서, 766
년에 조성된 석남사(石南寺)의 석조비로자나불이 여래형비로자나불의 최초예로서 각
각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로자나불은 밀교와는 상관없이 『화엄경』의 주불로
서 독창적으로 창안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로자나불은 여래형
비로자나불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과는 그 성격이 뚜렷이 구별된다.
불경에는 부처의 수는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무량(無量)하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불법, 큰 진리의 화신(化身)인 셈이다. 이들 부처와 부처의 관계는 불신관(佛神觀)으
로 설명되어진다. 불신관에서 설명하는 부처의 몸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응신(應
身)의 삼신설(三身說)이 일반적이다. 법신은 영원불멸한 불교의 진리 그 자체, 곧 진
여(眞如)를 말하며, 보신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서원(誓願)을 세워서 수행한 결
과 그 미덕에 의해 성불한 부처를 말하며, 응신은 이 세상에 출현한 부처를 가르킨다
. 석가모니불이 곧 응신불이며,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보신불, 여기서 다루는 비로자
나불이 법신불이다. 그러나 이들 삼신불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이다. 법신,보
신,응신은「일월삼신(一月三身)」 곧 달ㆍ달빛ㆍ물에 비친 달이라는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결국 비로자나불은 모든 불보살을 통합하는 동시에 모든 불보살을 비로자나불에서
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변상도나 조각에서는 십일면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비로자나불 공유의 수인인 지권인을 맺는 경우도 있다. 또 통일신라 말
기에는 석가삼존불과 비로자나불이 동일시되어 석가불의 협시보살인 문수(文殊)와
보현(普賢) 보살을 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존불이 만들어졌으며, 고려 이후에는 석
가와 노사나불을 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신불(三身佛)도 성행하였다. 비로자나불이
맺는 지권인은 비로자나의 위대하고 훌륭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여, 흔히 보리길상
인(普提吉祥印)이라고도 한다. 지권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형식
은 주먹쥔 왼손의 검지를 곧추 세우고 이 검지를 오른손으로 쥔 모습이 기본이다. 이
경우 곧추 세운 손가락이 위로 삐져 나오는 것을 가리기 위해 오른손의 구부린 검지
가 봉긋하게 솟게 된다. 드물게 좌우손의 위치가 뒤바뀐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조선시대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그 전형에서 벗어나 주
먹쥔 오른손 전체를 왼손으로 감싼 형식이 일반적이다.
3. 아미타불(阿彌陀佛)
아미타불은 수행에 의해 부처가 된 가장 대표적인 보신불(報身佛)이다. 부처는 반드
시 특정한 정토(淨土)를 가지기 마련이다. 아미타불 역시 지금도 서방에 극락정토를
열어 설법하고 있으며, 모든 중생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정토의 연꽃연못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에 의해 구제된다고 한다. 아미타불의 모습이나 극락정토의 모습
은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상세하게 언급 되어 있어 모든 아미타불 관계의 미
술은 이 관무량수경이 기본이 된다. 불교의 수많은 부처 가운데에서도 아미타불은
두개의 이름을 가진 특이한 예에 속한다. 무한한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Amitabha-
무량광여래(無量光如來)와, 현세에서의 수명장수 사상과 결부된 Amitayus-무량수여
래(無量壽如來)가 그것이다.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열반에 든 불타의 수명은 무량하
다는 무량수(無量壽)의 신앙에서부터 보신불로서의 무량수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Amitayus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이란의 광명사상(光明思想)이
서북 인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에 무량광여래의 이름이 더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남북조 시대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무량광 보다는 무량수불의 역
명(譯名)이 일반적인데, 명문에「무량수상일구(無量壽像一軀)」로 명기되어 있는 고
구려의 신묘명(辛卯銘) 금동일광삼존불(金銅一光三尊佛)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명문
이나 문헌상 상명이「아미타불(阿彌陀佛)」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수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초기 이후이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아미타여래상은 단독상일 경우 수인(手印)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그것은 석가여래상에 고유한 수인인 시무외(施無畏)ㆍ여원인(輿願印)의 통인(
通印)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맺은 아미타상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 통인
을 맺은 앞의 신묘명삼존불이나 통일신라 초기의 계미명아미타불비상(癸未銘阿彌陀
佛碑像), 그리고 항마촉지인을 맺은 고려 초기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의 소조(塑造
) 아미타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석가모니 성도의 순간을 상징하는 항마촉지
인이 아미타불은 물론 약사불에까지 채용된 것은 이 수인이 불타 그 자체를 상징하
는 하나의 보편적인 여래좌상 형식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군위삼존석불
과 같은 삼존불의 경우 보관에 화불(化佛)이 새겨진 관음보살이 왼쪽에, 정병이 새겨
진 세지보살(勢至菩薩)이 이 오른쪽에 협시하므로 아미타삼존불로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무위사(無爲寺)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과 같은 조선초기의 삼존불에서는 세
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이 협시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고려시대 이후의 아미타여래
상은 고유의 수인인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 중의 하나를 맺기 때문에 쉽게 구
별된다. 『무량수경』에 의하면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에는 중생의 신앙이나 성
품의 깊이에 따라 9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미타불의 수인으로 나타낸 것이
구품인이다. 구품인의 종류와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수인」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4. 약사여래(藥師如來)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과 무지의 병을 고쳐주고 재난을 구제하며, 옷과 음식을 만
족시켜주는 등 12가지 서원(誓願)을 세워 성불한 보신불(報身佛)로서, 약사유리광여
래(藥師유璃光如來), 대의왕불(大醫王佛), 또는 의왕선서(醫王善逝)라고도 한다. 이
여래는 단독상은 물론 사방불(四方佛)로도 조성되었는데, 이 경우 동쪽에 위치하여
동방유리광세계(東方유璃光世界)를 다스리는 부처임을 나타낸다.
어떤 종교도 그것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세 이익적인 신앙형태를 포
함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해탈에 이르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에서도 하나의 방
편(方便)으로서 현세에서의 이익을 주는 여러 부처를 출현시켜 대중의 신앙을 모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살로서는 관음보살, 여래로서는 약사불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
불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약사불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대상이다.
현세이익적 신앙은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약사
불 신앙도 상당히 늦게 성립되어, 수대(隋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경전이 한역된
다. 경전의 성립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약사여래의 정토를 아미타여래의
정토와 비교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아미타불 보다는 후
대에 성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약사상의 조성도 비교적 늦어 중국에서는 수
대(隋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당대(唐代)에 성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일본에서는 나라(奈良)시대부터 등장한다.
약사상은 특정한 수인(手印)을 매지는 않지만 흔히 손에 약 항아리(약옹(藥甕), 약기(
藥器))를 들고 있어 쉽게 구별된다. 예를 들면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輿願仁)의 통
인(通印)을 맺은 여래상의 한손에 약 항아리만을 올려 놓는다면 곧 약사상이 되는 셈
이다. 약 항아리를 들고 있지 않는 경우 명문이 없으면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중국과 일본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식의 약사상이 유행되어 한국
적인 신앙 형태와 도상(圖像) 특징을 보여준다. 삼국 말기 신라지역을 중심으로 유행
되었던 우견편단(右肩偏단)입상과,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했던 항마촉지인(降魔觸地
印)의 좌상이 그것이다. 앞의 것은 우견편단식으로 대의를 착용하고 엉덩이를 바깥
쪽으로 살짝 내민 율동적인 모습에 오른 손에 보주(寶珠)를 든 형식이며. 뒤의 것은
항마촉지인을 맺은 좌상의 왼손 위에 약단지를 올려놓은 형식이다. 앞에서도 설명했
듯이 석가모니의 성도(成道) 순간을 상징하는 항마촉지인이 약사불에까지 채용된 것
은 이 수인이 불타 그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여래좌상의 형식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약사여래상은 현세(現世)를 상징하는 일광(日光), 월광(月光)보살을 협시로 하여 삼존
불을 구성하며, 불화에서는 팔대보살(八代菩薩)이 협시하는 군도(群圖)형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 약사여래는 12신장(神將)을 거느리기도 하는데, 이는 약사여래가 중
생을 구제하고자 세운 12가지 서원(誓願)에 따라 나타난 신장이라고 한다.
5. 관음보살(觀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Avalokitesvara)은 불교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보살이다.「관
세음」이란 중생이 고통짓는 소리를 듣고 구원한다는 뜻으로 세상 모든 중생의 여망
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구제해 준다고 한다. 광세음(光世音), 관세음, 관음,
관세자재(觀世自在), 관자재(觀自在) 보살이라고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
는 고통과 두려움의 제거야말로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며, 그 주체가 바로 관세음보
살이다. 중생들의 모든 고난을 구제하고 복덕을 나누어 안락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구세주로서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상은 여래상 못지 않게 단독불로서도
널리 조성되었다.
관음보살상은 삼국시대부터 단독상으로서 또는 아미타불의 협시로서 널리 조성되었
는데, 처음에는 그 도상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삼국시대 말기부터 보관에 화불(化佛)
이 있고 손에 보병(寶甁)이나 연봉오리를 쥔 전형형식이 확립되게 된다. 그런데 백제
에서는 이러한 관음보살의 도상이 확립되기 전에 이상적인 관음의 모습으로 몸 앞에
서 양손을 모두 어보배구슬「보주(寶珠)」을 받든 보살입상을 창안하였다. 이 도상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적인 특징으로서 일본의 아스카시대 불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흔히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화불을 아미
타불의 화신으로 보기 쉽지만 그것은 법신(法身)으로서의 한 차원 높은 불타(佛陀)
그 자체를 상징한다.
관음은 자유로이 그 몸을 여러가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33응신설(應身說)과 밀
교의 영향 때문에 매우 종류가 다양하다. 여의륜(如意輪)관음, 십일면(十一面)관음,
불공나색(不空羅索)관음, 천수(千手)관음, 마두(馬頭)관음, 준지(准지)관음, 양류(楊柳
)관음, 백의(白衣)관음, 쇄수(灑手)관음 등등.. 이들 다양한 변화관음(變化觀音)은 곧
모든 중생을 두루 살펴서 구원한다는 관음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성립된 변화관음은 십일면관음으로 머리에 각기 다른 표정의 얼굴 10면이
안치되고 손에는 연꽃이 꽂힌 보병을 쥔 모습으로 표현된다. 석굴암 본존 뒷벽에 새
겨진 것, 경주 굴불사터 사방불에 새겨진 것, 경주 남산에서 나온 것 등 조각상의 수
는 많지 않다. 천 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천 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천수관음 또는 천수천안(天手天眼)관음은 관음의 무한한
자비력을 상징한다. 현실적으로 천 개의 손을 표현하기는 어려우므로 흔히 좌우 양
쪽에 20개씩의 손이 만들어진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 또한 준지관음은 흔히 여성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3개의 눈과 18개의 팔을 갖춘다. 이 역시 조각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으며, 고려시대 경상(鏡像)에 새겨진 유례가 있을 뿐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불화나 사경변상도 또는 경상에는 남해 바닷가의 보타낙산(補陀洛
山)에 거주하는 관음의 모습을 형상화한 수월「水月」관음과, 한손에 버드나무 가지
를 쥔 양류관음, 머리부터 흰옷을 걸친 백의관음, 그리고 해난(海難)을 구제하는 쇄
수관음도 활발하게 표현되었다. 이들은 교리상으로는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
만 당시의 고려인들에게는 동일한 관념으로 이해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쪽 무릎을
세운 윤왕좌(輪王座)의 자세를 취하는 수월관음은 드물게 조각상으로도 표현되었다.
6. 미륵보살(彌勒菩薩)과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
미륵(Maitreya)은 지금은 도솔천(兜率天)이라는 하늘나라에서 보살로 있지만 56억7
천만년 뒤 이 세상이 혼란스로울 때 부처로 태어나서 못다 구제한 중생을 구제해 준
다는 미래의 부처이다. 마치 대통령 당선자처럼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 이미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미래의 부처인 셈이다. 그래서 미륵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
화려한 장식을 걸친 보살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미륵의 인도 이름인 Maitreya란「인자함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다. 이를 중국
과 우리나라에서는「미륵(彌勒)」으로 표기하고「자씨(慈氏)」또는「자존(慈尊)」으
로 번역한다. 보살상으로 표현될 경우 인도에서는 원래 손에 병을 쥔 선 모습이, 중
국에서는 두 다리를 서로 교차시켜 의자에 앉은 모습(교각좌(交脚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의 미륵보살상은 보이지 않으며, 단지 삼국시대
에 크게 유행했던 반가사유상이 미륵보살로 간주되기도 한다. 부처 모습으로 표현될
때에는 경주남산의 장창곡에서 발견된 돌미륵삼존불이나 법주사 입구의 바위에 새
겨진 것처럼 의자에 앉은 모습(기자좌(기子坐))이 일반적이다.
한편 삼국시대말부터 통일신라 초기에 걸쳐 크게 유행했던 반가사유상은 가장 한국
적인 보살상이다. 왼 무릎 위에 오른 다리를 걸치고 고개숙인 얼굴의 뺨에 오른 손가
락을 살짝 대어 사유하는 모습의 반가사유상은 일찍이 인도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이러한 모습은 석가모니가 태자로 있을 때 인생무상을 사유하던 모습이어서 중국에
서는 태자사유상(太子思惟像)이라 하였는데, 하나의 독립된 보살상 모습으로 확립되
면서 반가사유상 또는 단순히 사유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신라의 화랑도는 미륵을 신봉하였고 그 우두머리인 국선(國仙)은 미륵의 분신으로
보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반가사유상들이 미륵불을 신봉했던 화랑도 유적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이를 미륵보살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리의 반가사유상은 일본의 아스카
, 하쿠호시대에 영향을 주어 광륭사(廣隆寺)와 중궁사(中宮寺) 반가사유상과 같은 수
많은 예를 남기고 있다.
7. 지장(地藏)보살
지장(地藏)보살이란 글자 뜻 그대로 「땅을 포장(包藏)」하는 보살, 곧 모든 만물을
골고루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대지(大地)의 덕을 의인화한 보살이다. 불교에서
는 석가모니가 입멸하여 56억7천만년이 지난 뒤에 미륵이 출현하여 중생들을 교화한
다고 하는데, 그 사이의 공백기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도록 석가로부터 의뢰받은 보
살이 곧 지장보살이다. 부처가 없는 혼란한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몸을 변화하여 나
타나 육도윤회(六道輪廻)에서 고통받는 중생, 특히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머리에 관을 쓰고 몸에는 장신구를 착용한 일반적인 보살상과는
달리 민머리의 스님 모습이거나 아니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에 보배 구슬이나 석
장(錫杖)을 쥔 모습으로 표현된다. 석장이란 스님네들이 길을 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나무 지팡이로 윗부분에 금속고리가 달려 있어 흔들면 소리가 난다. 이 석장의 소리
는 악한 것을 물리치고 불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 지장보살이 불교의 진
리를 상징하며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보주를 손에 쥐는 것도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가운데 머리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은 중국 본토와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고 중앙
아시아 지방과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형식이다. 조각에서는 그 성격이 민머리의 스
님 모습에 보주(寶珠)만 손에 쥔 경우가 많다.
지장보살은 독립상으로도 표현되지만 관음보살과 함께 아미타여래상의 협시로 표현
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는 관음과 세지보살이 일반적이지만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지장보살의
성격 때문에 세지보살 대신 아미타불의 협시로 등장하는 예가 많다. 절에서 지장보
살이 지장전(地藏殿)이나 명부전(冥府殿)의 주존으로 모셔질 경우에는 대부분 도명(
道明)과 무독귀왕(無毒鬼王)을 거느리는 지장삼존상 형식이거나 아니면 시왕(十王)을
거느리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8. 문수(文殊), 보현(普賢)보살
문수(Manjuari)보살은「지혜의 완성」이라는 깨달음의 경지, 곧 반야(般若)의 가르침
을 선양하는 보살이다. 이 보살은 1.2세기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곧바로
성립된 으뜸가는 위치에 있는 보살로서, 석가모니 열반 뒤 실제로 인도에 있었던 역
사적인 인물이라고도 한다.
문수보살은 거의 모든 대승불교 경전에 등장하지만 그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
어 있는 경전이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다. 이 경전에는 문수보살이 석가
여래의 대리로 유마거사(維摩居士)를 방문하여 불교의 철리(哲理)에 대해 논쟁하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지혜 제일의 대보살로서의 문수보살의 성격이 단
적으로 드러난다. 이 장면은 중국의 돈황석굴 같은 곳에서는 조각으로서도 흔히 표
현된다.
보현(Samanthabhadra)보살 역시 문수보살과 같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지
혜를 상징하는 문수에 대하여 덕행을 골고루 갖추어 부처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그
지혜를 몸소 실천하는 보살이다. 그러나 보현보살이 성립된 시기는 분수보살 보다는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수와 보현보살상은 관음보살이나 미륵보살, 또는 지장보살처럼 단독불로 만들어
지는 경우는 적고 석가여래나 비로자나불과 함께 삼존형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 두 보살상은 불상으로 표현될 때에도 앞의 보살상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
에 구애받지 않고 각 작품마다 그 모습이 조금식 다르게 나타나며 이 가운데 가장 많
이 보이는 특징이 연꽃 가지를 든 모습이다. 석굴암에서는 문수보살상이 오른손에
작은 잔을, 보현보살상은 왼손에 경책을 들고 있어 흥미롭다.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는 밀교(密敎)의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의 영향으로 문
수보살은 사자를 탄 모습으로,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
다. 이러한 문수, 보현보살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법수사(法水寺)의 비로자나 삼존불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시대 금동불감(
金銅佛龕)에 조각된 예 등 그 수가 많지 않다. 또 유명한 상원사의 조선시대 문수동
자상이나 다른 조선시대 불화에서처럼 문수와 보현보살은 어린애 모습(童子像)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문수와 보현보살의 분신, 곧 지혜의 동자, 실천의 동자로 해
석할 수 있다.
관세음(觀世音)이란 말은 항상 인간세상에서 중생들이 겪는 일을 바라보고, 그들의 청을 듣는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세음은 세상의 중생들에 대한 연민으로 성불을 포기하면서까지 불교의 교의를 계속 전파하는데 힘썼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그는 소멸의 운명을 맞아야 했으나, 마지막에 결국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세상에 남아 중생들에게 교의를 전할 수 있었다.
지금도 불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빈번히 찾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임을 보면, 중생을 위해 자신의 성불을 포기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대중들에게 깊숙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대다수 동북아시아 국가의 불교신자들에게 아름답고 단정한 여성의 형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원래부터 여성이었을까?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관세음보살은 남성이었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원래 남인도의 남성 신이었는데 3- 7세기에 거쳐 중인도의 마게타국에서 흥성하던 대승불교에 편입되어 문주보살과 함께 중국, 한국 및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남자 관세음보살은 흔히 상체를 드러내고 손에는 연꽃을 든 채 허리춤까지 늘어지는 반투명 가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머리에 관을 쓰거나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를 몸에 걸치기도 한다. 인도의 남성 관세음보살 역시 자비를 통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중생을 구원하는데, 힌두교의 신 비슈누와도 비슷한 역할이다.
티베트로 건너온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여전히 남성의 모습이다. 티베트에서 관세음은 티베트족의 창시자이자 수호신으로 숭앙되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신이자 윤회를 관장하는 신이며 11개의 머리와 8개의 팔을 가진 형상으로 묘사된다.
한편 불교가 중국 중원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대비관음, 천수관음, 백의관음, 송자관음 할 것 없이 모두 여성의 모습을 하게 된 것. 중국어로 기록된 고대 불교전적들도 모두 관세음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티베트에 전파될 때만 해도 남성이었던 관세음보살은 어째서 여성으로 바뀌게 된 걸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8세기 전후하여 당대의 화가들이 그린 관음상이 구슬이나 팔찌를 드리우고 있는 등 여성적 요소를 나타내면서 여성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선한 특성이 여성의 형상에서 더 잘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여성으로 바뀌어갔다는 설 등이 있다. 또 다른 가설로 당대에 중국에 전파된 성모마리아의 영향으로 성모마리아의 이미지가 관세음보살과 결합하여 여성으로 변했다는 설도 있다.
중국 관세음보살에 관한 전설 하나.
묘장왕의 딸 묘선공주는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수행과 중생의 구원에 뜻을 두었는데, 결혼하라는 부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형을 집행하려던 순간 공주를 겨누었던 칼은 둘로 갈라지고, 창은 가루로 변해 흩어졌다.
그럼에도 공주는 결국 죽임을 당했으나, 그가 지옥에 떨어지자 지옥이 천당으로 변해버리고, 염라대왕은 할 수 없이 공주를 인간세상으로 돌려보낸다. 인간세상으로 돌아와 보타산의 연꽃 위에 떨어진 묘선공주는 그곳에서 9년 동안 중생의 병을 고치고 고난에서 구원했다.
한편 묘장왕은 악행에 대한 업보로 불치의 병을 얻는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다른 사람의 한쪽 팔과 한쪽 눈을 내어야만 만들 수 있다. 아무도 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으나, 자비로운 묘선공주는 자신을 죽이려했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팔과 눈을 내놓아 아버지의 병을 고친다.
이에 감동한 묘장왕은 딸의 착한 마음씨를 기리고자 묘선공주의 상을 만들게 했는데, 팔과 눈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라는 명이 잘못 전해져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음상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후일 ‘천수천안 대자대비관음보살’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출처 http://newspic.cn.yahoo.com/science/article/index.html?type=gallery_show&p=49931
글 수 461

붓다
1. 석가(釋迦)
석가모니란 [샤카]족 출신의 성자(聖者)란 뜻이다. 즉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북부 가비라성(Kapila-vastu)의 별장인 룸비니 동산에서 왕자로 태어나 29세까지 태
자로 생활하다 출가하여 6년간 갖은 고행을 거쳐 인도 중부 나이란자나(Nairanjana)
강변에 있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성도한 고마타 싯달타(Gautama-Siddhaltha)
가 곧 석가모니인 것이다. 그 후 석가모니는 많은 신자를 모으고 45년 동안 설법한
뒤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게 된다. 당시 인도의 풍습에 따라 석가모니의 유해는 화
장(茶昆)되는데, 화장 후 많은 제자와 신자들은 앞다투어 그 유골을 나누어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손수 매장하여 그 무덤을 예배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유골
을 사리(私利, Sarira)라하여 특히 신성시 하고 그 무덤을 솔탑파(率塔婆, Stupa), 줄
여서 탑파라고 불렀다. 이 탑파의 표면은 온갖 조각으로 장엄되는데 이러한 탑 장엄
에서부터 불교미술이 꽃피게 되었다. 불법을 지키는 여러 신의 모습에서부터 석가모
니의 전생(前生)의 이야기(본생담(本生譚)),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석가모니의 일대
기(불전도(佛傳圖)), 연꽃이나 당초무늬 등의 장식문양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탑 장엄에서는 주인공인 석가모니의 모습은 절대로 표현되지 않고 수레바퀴(
법륜(法輪))나 대좌,불족(佛足), 보리수와 같은 상징물로 대체되는 점이 특징이다. 석
가모니의 입멸 후 그의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편집하였으며, 그의 가
르침을 따르는 승단(僧團)과 불교를 중흥시킨 아쇼카왕과 카니시카왕에 의해 불교는
종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여 서기 1세기 무렵 대승불교의 성립을 보게 되었
다.
이때부터 석가모니는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되어 성불(成佛)하기 전의 모습을 한
보살상과 성불한 여래상 등 두 형식의 예배상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다. 먼저 여
래상에서는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외인(施無畏印)과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준
다는 여원인(與願印)의 수인을 한 입상이 만들어 졌으며, 이어 보드가야에서 성도 순
간을 표현한 선정인(禪定印)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그리고 처음 설법할 때의 모
습인 초전법륜인(初轉法輪印)의 수인을 맺은 좌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초기 불탑에 흔히 조각되는 본생담이나 불전도가 표현된 예는 찾을 수 없다. 단
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불전도를 압축한 팔상도(八相圖)가 종종 그림으로 표
현되고, 이 장면 속의 석가모니상이 독립된 조각으로 널리 형상화 되었다. 팔상은 도
솔에서 내려오는 상(도솔래의상(兜率來儀像)), 룸비니동산에 내려오는 상(비람융생상
(毘藍隆生相)), 4문에 나가 관찰하는 상(서문유관상(西門遊觀相), 성을 넘어 출가하는
상(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설산에서 수도하는 상(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상(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포교하
는 상(녹원전법륜상(鹿圓轉法輪相)),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하는 상(쌍림열반상(雙林
涅槃相)) 등이다. 이들 상들은 이미 불상의 자세와 수인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가운
데 탄생불은 룸비니동산에서 어머니 마야(摩耶)부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태어나자마
자 7걸음을 걸으면서「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치며 자신의
절대성을 강조했다고 하는 탄생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흔히 상체는 나신에 아
랫도리에 짧은 치마를 걸친 직립의 모습에, 한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늘어뜨려 땅을 가르키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2.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Vairocana)은 태양의 빛처럼 불교의 진리가 우주 가득히 비
추이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부처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설법하지 않는 점이 특
징이다. 불교의 진리, 곧 불법(佛法) 그 자체를 상징하는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불상
으로서 형상화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속한다. 비로자나불의 모습은 처음에 중
국에서 노사나불(盧舍那佛)로서 그 도상이 불완전하게 시도되다가 밀교(密敎)에 수용
되어 대일여래(大日如來)로 불리면서 표현 형식이 확립되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는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비로자나불의 조성이 성행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비로자
나불의 모습은 일본 밀교의 금강계만다라(金剛系曼茶羅)의 주불인 보살 모습에 지권
인(智拳印)의 수인을 맺은 형식과, 태장계(胎藏系) 만다라의 주불인 법계정인(法界定
印)을 맺는 두 가지 형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754년에 제작된
신라 화엄경변상도(華嚴經變相圖)가 보살형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최초예로서, 766
년에 조성된 석남사(石南寺)의 석조비로자나불이 여래형비로자나불의 최초예로서 각
각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로자나불은 밀교와는 상관없이 『화엄경』의 주불로
서 독창적으로 창안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로자나불은 여래형
비로자나불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과는 그 성격이 뚜렷이 구별된다.
불경에는 부처의 수는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무량(無量)하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불법, 큰 진리의 화신(化身)인 셈이다. 이들 부처와 부처의 관계는 불신관(佛神觀)으
로 설명되어진다. 불신관에서 설명하는 부처의 몸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응신(應
身)의 삼신설(三身說)이 일반적이다. 법신은 영원불멸한 불교의 진리 그 자체, 곧 진
여(眞如)를 말하며, 보신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서원(誓願)을 세워서 수행한 결
과 그 미덕에 의해 성불한 부처를 말하며, 응신은 이 세상에 출현한 부처를 가르킨다
. 석가모니불이 곧 응신불이며,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보신불, 여기서 다루는 비로자
나불이 법신불이다. 그러나 이들 삼신불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이다. 법신,보
신,응신은「일월삼신(一月三身)」 곧 달ㆍ달빛ㆍ물에 비친 달이라는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결국 비로자나불은 모든 불보살을 통합하는 동시에 모든 불보살을 비로자나불에서
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변상도나 조각에서는 십일면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비로자나불 공유의 수인인 지권인을 맺는 경우도 있다. 또 통일신라 말
기에는 석가삼존불과 비로자나불이 동일시되어 석가불의 협시보살인 문수(文殊)와
보현(普賢) 보살을 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존불이 만들어졌으며, 고려 이후에는 석
가와 노사나불을 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신불(三身佛)도 성행하였다. 비로자나불이
맺는 지권인은 비로자나의 위대하고 훌륭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여, 흔히 보리길상
인(普提吉祥印)이라고도 한다. 지권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형식
은 주먹쥔 왼손의 검지를 곧추 세우고 이 검지를 오른손으로 쥔 모습이 기본이다. 이
경우 곧추 세운 손가락이 위로 삐져 나오는 것을 가리기 위해 오른손의 구부린 검지
가 봉긋하게 솟게 된다. 드물게 좌우손의 위치가 뒤바뀐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조선시대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그 전형에서 벗어나 주
먹쥔 오른손 전체를 왼손으로 감싼 형식이 일반적이다.
3. 아미타불(阿彌陀佛)
아미타불은 수행에 의해 부처가 된 가장 대표적인 보신불(報身佛)이다. 부처는 반드
시 특정한 정토(淨土)를 가지기 마련이다. 아미타불 역시 지금도 서방에 극락정토를
열어 설법하고 있으며, 모든 중생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정토의 연꽃연못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에 의해 구제된다고 한다. 아미타불의 모습이나 극락정토의 모습
은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상세하게 언급 되어 있어 모든 아미타불 관계의 미
술은 이 관무량수경이 기본이 된다. 불교의 수많은 부처 가운데에서도 아미타불은
두개의 이름을 가진 특이한 예에 속한다. 무한한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Amitabha-
무량광여래(無量光如來)와, 현세에서의 수명장수 사상과 결부된 Amitayus-무량수여
래(無量壽如來)가 그것이다.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열반에 든 불타의 수명은 무량하
다는 무량수(無量壽)의 신앙에서부터 보신불로서의 무량수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Amitayus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이란의 광명사상(光明思想)이
서북 인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에 무량광여래의 이름이 더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남북조 시대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무량광 보다는 무량수불의 역
명(譯名)이 일반적인데, 명문에「무량수상일구(無量壽像一軀)」로 명기되어 있는 고
구려의 신묘명(辛卯銘) 금동일광삼존불(金銅一光三尊佛)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명문
이나 문헌상 상명이「아미타불(阿彌陀佛)」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수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초기 이후이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아미타여래상은 단독상일 경우 수인(手印)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그것은 석가여래상에 고유한 수인인 시무외(施無畏)ㆍ여원인(輿願印)의 통인(
通印)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맺은 아미타상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 통인
을 맺은 앞의 신묘명삼존불이나 통일신라 초기의 계미명아미타불비상(癸未銘阿彌陀
佛碑像), 그리고 항마촉지인을 맺은 고려 초기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의 소조(塑造
) 아미타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석가모니 성도의 순간을 상징하는 항마촉지
인이 아미타불은 물론 약사불에까지 채용된 것은 이 수인이 불타 그 자체를 상징하
는 하나의 보편적인 여래좌상 형식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군위삼존석불
과 같은 삼존불의 경우 보관에 화불(化佛)이 새겨진 관음보살이 왼쪽에, 정병이 새겨
진 세지보살(勢至菩薩)이 이 오른쪽에 협시하므로 아미타삼존불로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무위사(無爲寺)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과 같은 조선초기의 삼존불에서는 세
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이 협시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고려시대 이후의 아미타여래
상은 고유의 수인인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 중의 하나를 맺기 때문에 쉽게 구
별된다. 『무량수경』에 의하면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에는 중생의 신앙이나 성
품의 깊이에 따라 9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미타불의 수인으로 나타낸 것이
구품인이다. 구품인의 종류와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수인」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4. 약사여래(藥師如來)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과 무지의 병을 고쳐주고 재난을 구제하며, 옷과 음식을 만
족시켜주는 등 12가지 서원(誓願)을 세워 성불한 보신불(報身佛)로서, 약사유리광여
래(藥師유璃光如來), 대의왕불(大醫王佛), 또는 의왕선서(醫王善逝)라고도 한다. 이
여래는 단독상은 물론 사방불(四方佛)로도 조성되었는데, 이 경우 동쪽에 위치하여
동방유리광세계(東方유璃光世界)를 다스리는 부처임을 나타낸다.
어떤 종교도 그것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세 이익적인 신앙형태를 포
함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해탈에 이르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에서도 하나의 방
편(方便)으로서 현세에서의 이익을 주는 여러 부처를 출현시켜 대중의 신앙을 모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살로서는 관음보살, 여래로서는 약사불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
불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약사불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대상이다.
현세이익적 신앙은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약사
불 신앙도 상당히 늦게 성립되어, 수대(隋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경전이 한역된
다. 경전의 성립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약사여래의 정토를 아미타여래의
정토와 비교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아미타불 보다는 후
대에 성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약사상의 조성도 비교적 늦어 중국에서는 수
대(隋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당대(唐代)에 성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일본에서는 나라(奈良)시대부터 등장한다.
약사상은 특정한 수인(手印)을 매지는 않지만 흔히 손에 약 항아리(약옹(藥甕), 약기(
藥器))를 들고 있어 쉽게 구별된다. 예를 들면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輿願仁)의 통
인(通印)을 맺은 여래상의 한손에 약 항아리만을 올려 놓는다면 곧 약사상이 되는 셈
이다. 약 항아리를 들고 있지 않는 경우 명문이 없으면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중국과 일본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식의 약사상이 유행되어 한국
적인 신앙 형태와 도상(圖像) 특징을 보여준다. 삼국 말기 신라지역을 중심으로 유행
되었던 우견편단(右肩偏단)입상과,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했던 항마촉지인(降魔觸地
印)의 좌상이 그것이다. 앞의 것은 우견편단식으로 대의를 착용하고 엉덩이를 바깥
쪽으로 살짝 내민 율동적인 모습에 오른 손에 보주(寶珠)를 든 형식이며. 뒤의 것은
항마촉지인을 맺은 좌상의 왼손 위에 약단지를 올려놓은 형식이다. 앞에서도 설명했
듯이 석가모니의 성도(成道) 순간을 상징하는 항마촉지인이 약사불에까지 채용된 것
은 이 수인이 불타 그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여래좌상의 형식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약사여래상은 현세(現世)를 상징하는 일광(日光), 월광(月光)보살을 협시로 하여 삼존
불을 구성하며, 불화에서는 팔대보살(八代菩薩)이 협시하는 군도(群圖)형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또 약사여래는 12신장(神將)을 거느리기도 하는데, 이는 약사여래가 중
생을 구제하고자 세운 12가지 서원(誓願)에 따라 나타난 신장이라고 한다.
5. 관음보살(觀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Avalokitesvara)은 불교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보살이다.「관
세음」이란 중생이 고통짓는 소리를 듣고 구원한다는 뜻으로 세상 모든 중생의 여망
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구제해 준다고 한다. 광세음(光世音), 관세음, 관음,
관세자재(觀世自在), 관자재(觀自在) 보살이라고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
는 고통과 두려움의 제거야말로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며, 그 주체가 바로 관세음보
살이다. 중생들의 모든 고난을 구제하고 복덕을 나누어 안락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구세주로서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상은 여래상 못지 않게 단독불로서도
널리 조성되었다.
관음보살상은 삼국시대부터 단독상으로서 또는 아미타불의 협시로서 널리 조성되었
는데, 처음에는 그 도상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삼국시대 말기부터 보관에 화불(化佛)
이 있고 손에 보병(寶甁)이나 연봉오리를 쥔 전형형식이 확립되게 된다. 그런데 백제
에서는 이러한 관음보살의 도상이 확립되기 전에 이상적인 관음의 모습으로 몸 앞에
서 양손을 모두 어보배구슬「보주(寶珠)」을 받든 보살입상을 창안하였다. 이 도상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적인 특징으로서 일본의 아스카시대 불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흔히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화불을 아미
타불의 화신으로 보기 쉽지만 그것은 법신(法身)으로서의 한 차원 높은 불타(佛陀)
그 자체를 상징한다.
관음은 자유로이 그 몸을 여러가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33응신설(應身說)과 밀
교의 영향 때문에 매우 종류가 다양하다. 여의륜(如意輪)관음, 십일면(十一面)관음,
불공나색(不空羅索)관음, 천수(千手)관음, 마두(馬頭)관음, 준지(准지)관음, 양류(楊柳
)관음, 백의(白衣)관음, 쇄수(灑手)관음 등등.. 이들 다양한 변화관음(變化觀音)은 곧
모든 중생을 두루 살펴서 구원한다는 관음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성립된 변화관음은 십일면관음으로 머리에 각기 다른 표정의 얼굴 10면이
안치되고 손에는 연꽃이 꽂힌 보병을 쥔 모습으로 표현된다. 석굴암 본존 뒷벽에 새
겨진 것, 경주 굴불사터 사방불에 새겨진 것, 경주 남산에서 나온 것 등 조각상의 수
는 많지 않다. 천 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천 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천수관음 또는 천수천안(天手天眼)관음은 관음의 무한한
자비력을 상징한다. 현실적으로 천 개의 손을 표현하기는 어려우므로 흔히 좌우 양
쪽에 20개씩의 손이 만들어진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 또한 준지관음은 흔히 여성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3개의 눈과 18개의 팔을 갖춘다. 이 역시 조각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으며, 고려시대 경상(鏡像)에 새겨진 유례가 있을 뿐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불화나 사경변상도 또는 경상에는 남해 바닷가의 보타낙산(補陀洛
山)에 거주하는 관음의 모습을 형상화한 수월「水月」관음과, 한손에 버드나무 가지
를 쥔 양류관음, 머리부터 흰옷을 걸친 백의관음, 그리고 해난(海難)을 구제하는 쇄
수관음도 활발하게 표현되었다. 이들은 교리상으로는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
만 당시의 고려인들에게는 동일한 관념으로 이해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쪽 무릎을
세운 윤왕좌(輪王座)의 자세를 취하는 수월관음은 드물게 조각상으로도 표현되었다.
6. 미륵보살(彌勒菩薩)과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
미륵(Maitreya)은 지금은 도솔천(兜率天)이라는 하늘나라에서 보살로 있지만 56억7
천만년 뒤 이 세상이 혼란스로울 때 부처로 태어나서 못다 구제한 중생을 구제해 준
다는 미래의 부처이다. 마치 대통령 당선자처럼 석가모니의 뒤를 이어 이미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미래의 부처인 셈이다. 그래서 미륵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
화려한 장식을 걸친 보살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미륵의 인도 이름인 Maitreya란「인자함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다. 이를 중국
과 우리나라에서는「미륵(彌勒)」으로 표기하고「자씨(慈氏)」또는「자존(慈尊)」으
로 번역한다. 보살상으로 표현될 경우 인도에서는 원래 손에 병을 쥔 선 모습이, 중
국에서는 두 다리를 서로 교차시켜 의자에 앉은 모습(교각좌(交脚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의 미륵보살상은 보이지 않으며, 단지 삼국시대
에 크게 유행했던 반가사유상이 미륵보살로 간주되기도 한다. 부처 모습으로 표현될
때에는 경주남산의 장창곡에서 발견된 돌미륵삼존불이나 법주사 입구의 바위에 새
겨진 것처럼 의자에 앉은 모습(기자좌(기子坐))이 일반적이다.
한편 삼국시대말부터 통일신라 초기에 걸쳐 크게 유행했던 반가사유상은 가장 한국
적인 보살상이다. 왼 무릎 위에 오른 다리를 걸치고 고개숙인 얼굴의 뺨에 오른 손가
락을 살짝 대어 사유하는 모습의 반가사유상은 일찍이 인도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이러한 모습은 석가모니가 태자로 있을 때 인생무상을 사유하던 모습이어서 중국에
서는 태자사유상(太子思惟像)이라 하였는데, 하나의 독립된 보살상 모습으로 확립되
면서 반가사유상 또는 단순히 사유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신라의 화랑도는 미륵을 신봉하였고 그 우두머리인 국선(國仙)은 미륵의 분신으로
보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반가사유상들이 미륵불을 신봉했던 화랑도 유적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이를 미륵보살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리의 반가사유상은 일본의 아스카
, 하쿠호시대에 영향을 주어 광륭사(廣隆寺)와 중궁사(中宮寺) 반가사유상과 같은 수
많은 예를 남기고 있다.
7. 지장(地藏)보살
지장(地藏)보살이란 글자 뜻 그대로 「땅을 포장(包藏)」하는 보살, 곧 모든 만물을
골고루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대지(大地)의 덕을 의인화한 보살이다. 불교에서
는 석가모니가 입멸하여 56억7천만년이 지난 뒤에 미륵이 출현하여 중생들을 교화한
다고 하는데, 그 사이의 공백기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도록 석가로부터 의뢰받은 보
살이 곧 지장보살이다. 부처가 없는 혼란한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몸을 변화하여 나
타나 육도윤회(六道輪廻)에서 고통받는 중생, 특히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머리에 관을 쓰고 몸에는 장신구를 착용한 일반적인 보살상과는
달리 민머리의 스님 모습이거나 아니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에 보배 구슬이나 석
장(錫杖)을 쥔 모습으로 표현된다. 석장이란 스님네들이 길을 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나무 지팡이로 윗부분에 금속고리가 달려 있어 흔들면 소리가 난다. 이 석장의 소리
는 악한 것을 물리치고 불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 지장보살이 불교의 진
리를 상징하며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보주를 손에 쥐는 것도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가운데 머리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은 중국 본토와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고 중앙
아시아 지방과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형식이다. 조각에서는 그 성격이 민머리의 스
님 모습에 보주(寶珠)만 손에 쥔 경우가 많다.
지장보살은 독립상으로도 표현되지만 관음보살과 함께 아미타여래상의 협시로 표현
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는 관음과 세지보살이 일반적이지만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지장보살의
성격 때문에 세지보살 대신 아미타불의 협시로 등장하는 예가 많다. 절에서 지장보
살이 지장전(地藏殿)이나 명부전(冥府殿)의 주존으로 모셔질 경우에는 대부분 도명(
道明)과 무독귀왕(無毒鬼王)을 거느리는 지장삼존상 형식이거나 아니면 시왕(十王)을
거느리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8. 문수(文殊), 보현(普賢)보살
문수(Manjuari)보살은「지혜의 완성」이라는 깨달음의 경지, 곧 반야(般若)의 가르침
을 선양하는 보살이다. 이 보살은 1.2세기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곧바로
성립된 으뜸가는 위치에 있는 보살로서, 석가모니 열반 뒤 실제로 인도에 있었던 역
사적인 인물이라고도 한다.
문수보살은 거의 모든 대승불교 경전에 등장하지만 그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
어 있는 경전이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다. 이 경전에는 문수보살이 석가
여래의 대리로 유마거사(維摩居士)를 방문하여 불교의 철리(哲理)에 대해 논쟁하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지혜 제일의 대보살로서의 문수보살의 성격이 단
적으로 드러난다. 이 장면은 중국의 돈황석굴 같은 곳에서는 조각으로서도 흔히 표
현된다.
보현(Samanthabhadra)보살 역시 문수보살과 같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지
혜를 상징하는 문수에 대하여 덕행을 골고루 갖추어 부처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그
지혜를 몸소 실천하는 보살이다. 그러나 보현보살이 성립된 시기는 분수보살 보다는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수와 보현보살상은 관음보살이나 미륵보살, 또는 지장보살처럼 단독불로 만들어
지는 경우는 적고 석가여래나 비로자나불과 함께 삼존형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 두 보살상은 불상으로 표현될 때에도 앞의 보살상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
에 구애받지 않고 각 작품마다 그 모습이 조금식 다르게 나타나며 이 가운데 가장 많
이 보이는 특징이 연꽃 가지를 든 모습이다. 석굴암에서는 문수보살상이 오른손에
작은 잔을, 보현보살상은 왼손에 경책을 들고 있어 흥미롭다.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는 밀교(密敎)의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의 영향으로 문
수보살은 사자를 탄 모습으로,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
다. 이러한 문수, 보현보살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법수사(法水寺)의 비로자나 삼존불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시대 금동불감(
金銅佛龕)에 조각된 예 등 그 수가 많지 않다. 또 유명한 상원사의 조선시대 문수동
자상이나 다른 조선시대 불화에서처럼 문수와 보현보살은 어린애 모습(童子像)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문수와 보현보살의 분신, 곧 지혜의 동자, 실천의 동자로 해
석할 수 있다.
2008.07.27 21:05:08 (*.188.157.105)
관세음(觀世音)이란 말은 항상 인간세상에서 중생들이 겪는 일을 바라보고, 그들의 청을 듣는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세음은 세상의 중생들에 대한 연민으로 성불을 포기하면서까지 불교의 교의를 계속 전파하는데 힘썼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그는 소멸의 운명을 맞아야 했으나, 마지막에 결국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세상에 남아 중생들에게 교의를 전할 수 있었다.
지금도 불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빈번히 찾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임을 보면, 중생을 위해 자신의 성불을 포기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대중들에게 깊숙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대다수 동북아시아 국가의 불교신자들에게 아름답고 단정한 여성의 형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원래부터 여성이었을까?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관세음보살은 남성이었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원래 남인도의 남성 신이었는데 3- 7세기에 거쳐 중인도의 마게타국에서 흥성하던 대승불교에 편입되어 문주보살과 함께 중국, 한국 및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남자 관세음보살은 흔히 상체를 드러내고 손에는 연꽃을 든 채 허리춤까지 늘어지는 반투명 가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머리에 관을 쓰거나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를 몸에 걸치기도 한다. 인도의 남성 관세음보살 역시 자비를 통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중생을 구원하는데, 힌두교의 신 비슈누와도 비슷한 역할이다.
티베트로 건너온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여전히 남성의 모습이다. 티베트에서 관세음은 티베트족의 창시자이자 수호신으로 숭앙되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신이자 윤회를 관장하는 신이며 11개의 머리와 8개의 팔을 가진 형상으로 묘사된다.
한편 불교가 중국 중원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대비관음, 천수관음, 백의관음, 송자관음 할 것 없이 모두 여성의 모습을 하게 된 것. 중국어로 기록된 고대 불교전적들도 모두 관세음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티베트에 전파될 때만 해도 남성이었던 관세음보살은 어째서 여성으로 바뀌게 된 걸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8세기 전후하여 당대의 화가들이 그린 관음상이 구슬이나 팔찌를 드리우고 있는 등 여성적 요소를 나타내면서 여성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선한 특성이 여성의 형상에서 더 잘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여성으로 바뀌어갔다는 설 등이 있다. 또 다른 가설로 당대에 중국에 전파된 성모마리아의 영향으로 성모마리아의 이미지가 관세음보살과 결합하여 여성으로 변했다는 설도 있다.
중국 관세음보살에 관한 전설 하나.
묘장왕의 딸 묘선공주는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수행과 중생의 구원에 뜻을 두었는데, 결혼하라는 부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형을 집행하려던 순간 공주를 겨누었던 칼은 둘로 갈라지고, 창은 가루로 변해 흩어졌다.
그럼에도 공주는 결국 죽임을 당했으나, 그가 지옥에 떨어지자 지옥이 천당으로 변해버리고, 염라대왕은 할 수 없이 공주를 인간세상으로 돌려보낸다. 인간세상으로 돌아와 보타산의 연꽃 위에 떨어진 묘선공주는 그곳에서 9년 동안 중생의 병을 고치고 고난에서 구원했다.
한편 묘장왕은 악행에 대한 업보로 불치의 병을 얻는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다른 사람의 한쪽 팔과 한쪽 눈을 내어야만 만들 수 있다. 아무도 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으나, 자비로운 묘선공주는 자신을 죽이려했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팔과 눈을 내놓아 아버지의 병을 고친다.
이에 감동한 묘장왕은 딸의 착한 마음씨를 기리고자 묘선공주의 상을 만들게 했는데, 팔과 눈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라는 명이 잘못 전해져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음상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후일 ‘천수천안 대자대비관음보살’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출처 http://newspic.cn.yahoo.com/science/article/index.html?type=gallery_show&p=49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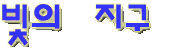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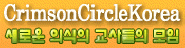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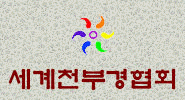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란 '다른 표현의 같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태교의 '여호와'도 같은 분으로,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약 4천 년 전 구약 성경에 따르면 2명의 아들을 둔 아브라함이 나온다.
그의 첫째 아들이자 서자인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러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
그 후손들은 그분을 '알라'라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
마리아의 수태를 예고한 천사 가브리엘이 610년쯤 나타나, 알라신의 예언자 마호메트에게 신의 계시를 들려준다.
이것이 코란이다.
'알라', '하느님', '하나님'은 같은 분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인간들의 불완전한 이해가 같은 '그분'을 다른 분으로 혼동해 버린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결국은 충돌을 일으키게 됐다.
같은 그분을 섬기면서 상대를 말살하려고 한, 지우고 싶은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