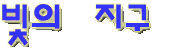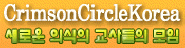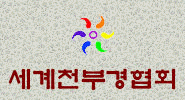명상 수행

숨겨야 강해진다.
* 파파야 과일
-바보인척 살아가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똑똑하면서 바보인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서(徐)교수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있던 본인에게 자주하던 말이다.
‘難得糊塗(난득호도)!
바보(糊塗)인척 하기는 정말 어려운(難))일이다.’ 원래는 청(淸)나라 문학가인 鄭板橋(정판교)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색깔을 감추고 적당히 이데올로기와 영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인생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난드어후투(難得糊塗)’의 철학이 중국의 일부 지식인만의 인생철학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본인이 중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방문했던 적잖은 집에서 이 글귀를 발견하였고 심지어 서울의 황학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의 ‘판지아위엔(潘家園)’ 고물(古物) 거리에서도 이 글귀를 이용한 물건이 자주 눈에 뛰었다.
중국인들은 왜 똑똑한 자신의 능력을 왜 감추려 하는 것일까? 왜 바보 같은 사람인양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중요한 처세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아주 다양하다. 자신의 본 모습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고도의 위장술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안심시켜 좀 더 강한 공격의 효과를 기대하는 전술일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낌없이 드러내 보이는 한국인은 이런 면에서 고수(高手)가 아니다. 비록 순진함과 솔직함이 아름답다고 해도 ‘난드어후투’의 인생철학에서 보면 하수(下手)들인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자신의 모습과 의도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도와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나의 의도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形人而我無形).”
상대방의 의도는 거울을 보듯이 빤히 알고 있고 나의 의도는 상대방이 전혀 모를 때 나의 힘은 적에게 압도적으로 커진다. 낮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만만하던 산이 캄캄한 저녁이 되어 그 앞에 서면 어떤 공포감에 전율하게 된다. 이것이 형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형(無形)에 대한 공포감이다. 상대방보다 훨씬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손자는 무형(無形)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의도를 적이 모르면 나는 전력과 병력을 집중(專)시킬 수 있고 적의 전력은 분산(分)될 수밖에 없다(我專而敵分). 내가 전력을 집중시켜 하나로 힘을 모을 때(我專爲一) 적은 분산되어 적의 힘은 분산되어 열로 나누어지게 된다(敵分爲十). 이럴 때 나의 힘은 적의 10배가 되어 하나로 나누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是以十攻其一也). 결국 처음엔 똑같은 숫자로 적과 만났지만 집중된 나는 숫자가 많게 되고(衆) 분산된 적은 숫자가 적게(寡)된다(我衆而敵寡). 이렇게 많은 숫자로 적의 적은 숫자를 공격하면(能以衆擊寡者) 나와 대결하는 상대방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吾之所與戰者 約矣).’ 다소 장황하더라도 손자의 이 날카로운 논리는 눈여겨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시간에 따라 상대방과 나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이렇다. 상대방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전력(戰力)의 우열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무형(無形)으로 나의 의도를 감추었고 적은 자신의 의도를 나에게 보이고 말았다(形人). 이 갈림길에서 적과 나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무형(無形)에서 ⇒ 전(專) ⇒ 십(十) ⇒ 중(衆) ⇒ 승(勝)으로 발전하고 적은 형인(形人)에서 ⇒ 분(分) ⇒ 일(一) ⇒ 과(寡) ⇒ 패(敗)의 결과로 발전한 것이다. 승패를 결정하는 원인은 간단한 것이었다. 결국 자신의 의도와 실체를 적에게 노출 시키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다.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내가 조절한다.
손자가 말하는 시형법이란 상대방에게 내 모습을 자유자재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상대방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내 의도대로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이 시형법의 내용이다.
시형법은 12가지의 전술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전술이
‘능력이 있어도 적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라(能而示之不能)!’이다. ‘매가 먹이를 채려고 할 때는 날개를 움츠리고 나직이 날며, 맹수가 다른 짐승을 노릴 때는 귀를 세우고 엎드리고, 현명한 사람이 움직이려고 할 때는 어리석은 듯한 얼굴빛을 한다.’ 또 다른 병법서인 육도(六韜)에 나오는 이야기다. 결정적인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의도를 겉으로 보이지 않아야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목표는 항상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손자의 후견인 노릇을 한 초(楚)나라 오자서(伍子胥)의 친구 요리(要離)는 무적의 검객이었다. 그는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 ‘자객열전’에도 등장하는 당시의 최고 협객이었다.
그는 당시 어떤 사람과 맞서도 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가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하였다.
‘항상 수비하는 자세로 적을 맞이하라! 적을 만나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 그리고 성급한 적의 공격 속에 비어있는 허점을 찾아 불시에 공격한다.’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적에게 보이는 시형법(示形法)의 진수다. 중국 사람들이 ‘난드어후투(難得糊塗)’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철학이 ‘도회지술(韜晦之術)’이다. 도회지술은 세상을 사는 도가(道家) 철학적 지혜다. 도(韜)는 ‘숨긴다.’ ‘칼집에 칼을 집어넣는다.’는 뜻이다. 회(晦)는 그믐이다. 달이 자신의 광채를 감추는 날이기도 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칼집에 집어넣고, 자신이 가진 광채를 숨기며 살아가는 인생철학이 도회지술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水至淸則無魚),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人至察則無徒)’는 속담이 있다.
너무 똑똑한 척 하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지도자는 멍청한 듯해야 사람이 따른다. 직원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따지면 그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지 못한다. 어떤 때는 알고도 모르는 척 자신의 칼날을 감출 필요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직원이 부지런히 준비해서 설명하면 모르는 척 들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장이 하는 말이 뻔히 무슨 의도인지 알아도 모른척해야 할 때가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의 일이다. 정(鄭)나라의 무공(武公)은 이웃 나라인 호(胡)에 대하여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공은 먼저 호나라를 안심시키려고 자신의 딸 중에 한명을 호나라 왕에게 시집보냈다.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호나라를 침략하여 자신의 나라와 합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조정 중신회의에서 이렇게 물었다. ‘과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이때 관기사(關其思)란 신하기 왕의 의도를 꿰뚫고 호나라를 먼저 공격하여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왕은 내심 자신의 의도가 드러난 것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신하는 과인에게 사돈 나라를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소. 호나라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이거늘 싸움을 부추기는 저 관기사의 목을 베라!’ 관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호나라는 안심하였고, 그 틈을 타서 정나라는 호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켜 버렸다. 관기사는 왕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모른 척 감출 수 있는 지혜는 없었던 것이었다. 때로는 안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침묵이 더욱 값질 때가 있다.
침묵과 관련한 이런 시가 있다.
“사람을 만나서 30%만 말하라(逢人且說三分話)! 내 마음 한 조각 모두 보여주지는 말아라(未可全抛一片心)! 호랑이 세 번 입 벌리는 것은 두렵지 않다(不?虎生三個口). 인간의 수시로 변하는 두 마음이 더욱 두렵구나(只恐人情兩樣心).”
정보는 생명이다.
내가 방심하여 말한 정보가 결국 조직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내가 공격하여 싸우려는 곳을 적이 모르게 해야 한다. 적이 몰라야 지켜야 할 곳이 많게 된다. 적이 지켜야 할 곳이 많아야 내가 맞이해서 싸울 적이 적게 된다.’ 이 평범한 손자병법의 논리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는 윤리학자가 아니다. 조직을 망하게 하고 직원들을 거리로 내모는 지도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 상대방의 허(虛)를 찾아야 한다.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하여 상대방을 안심시켜야 한다.
“상대방의 의도와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나의 의도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形人而我無形).” 손자의 이 명언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다차원지구 사이트에서
글 수 461

숨겨야 강해진다.
* 파파야 과일
-바보인척 살아가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똑똑하면서 바보인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서(徐)교수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있던 본인에게 자주하던 말이다.
‘難得糊塗(난득호도)!
바보(糊塗)인척 하기는 정말 어려운(難))일이다.’ 원래는 청(淸)나라 문학가인 鄭板橋(정판교)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색깔을 감추고 적당히 이데올로기와 영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인생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난드어후투(難得糊塗)’의 철학이 중국의 일부 지식인만의 인생철학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본인이 중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방문했던 적잖은 집에서 이 글귀를 발견하였고 심지어 서울의 황학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의 ‘판지아위엔(潘家園)’ 고물(古物) 거리에서도 이 글귀를 이용한 물건이 자주 눈에 뛰었다.
중국인들은 왜 똑똑한 자신의 능력을 왜 감추려 하는 것일까? 왜 바보 같은 사람인양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중요한 처세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아주 다양하다. 자신의 본 모습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고도의 위장술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안심시켜 좀 더 강한 공격의 효과를 기대하는 전술일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낌없이 드러내 보이는 한국인은 이런 면에서 고수(高手)가 아니다. 비록 순진함과 솔직함이 아름답다고 해도 ‘난드어후투’의 인생철학에서 보면 하수(下手)들인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자신의 모습과 의도를 상대방에게 보이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도와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나의 의도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形人而我無形).”
상대방의 의도는 거울을 보듯이 빤히 알고 있고 나의 의도는 상대방이 전혀 모를 때 나의 힘은 적에게 압도적으로 커진다. 낮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만만하던 산이 캄캄한 저녁이 되어 그 앞에 서면 어떤 공포감에 전율하게 된다. 이것이 형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형(無形)에 대한 공포감이다. 상대방보다 훨씬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손자는 무형(無形)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의도를 적이 모르면 나는 전력과 병력을 집중(專)시킬 수 있고 적의 전력은 분산(分)될 수밖에 없다(我專而敵分). 내가 전력을 집중시켜 하나로 힘을 모을 때(我專爲一) 적은 분산되어 적의 힘은 분산되어 열로 나누어지게 된다(敵分爲十). 이럴 때 나의 힘은 적의 10배가 되어 하나로 나누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是以十攻其一也). 결국 처음엔 똑같은 숫자로 적과 만났지만 집중된 나는 숫자가 많게 되고(衆) 분산된 적은 숫자가 적게(寡)된다(我衆而敵寡). 이렇게 많은 숫자로 적의 적은 숫자를 공격하면(能以衆擊寡者) 나와 대결하는 상대방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吾之所與戰者 約矣).’ 다소 장황하더라도 손자의 이 날카로운 논리는 눈여겨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시간에 따라 상대방과 나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이렇다. 상대방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전력(戰力)의 우열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무형(無形)으로 나의 의도를 감추었고 적은 자신의 의도를 나에게 보이고 말았다(形人). 이 갈림길에서 적과 나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무형(無形)에서 ⇒ 전(專) ⇒ 십(十) ⇒ 중(衆) ⇒ 승(勝)으로 발전하고 적은 형인(形人)에서 ⇒ 분(分) ⇒ 일(一) ⇒ 과(寡) ⇒ 패(敗)의 결과로 발전한 것이다. 승패를 결정하는 원인은 간단한 것이었다. 결국 자신의 의도와 실체를 적에게 노출 시키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다.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내가 조절한다.
손자가 말하는 시형법이란 상대방에게 내 모습을 자유자재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상대방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내 의도대로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이 시형법의 내용이다.
시형법은 12가지의 전술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전술이
‘능력이 있어도 적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라(能而示之不能)!’이다. ‘매가 먹이를 채려고 할 때는 날개를 움츠리고 나직이 날며, 맹수가 다른 짐승을 노릴 때는 귀를 세우고 엎드리고, 현명한 사람이 움직이려고 할 때는 어리석은 듯한 얼굴빛을 한다.’ 또 다른 병법서인 육도(六韜)에 나오는 이야기다. 결정적인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의도를 겉으로 보이지 않아야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목표는 항상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손자의 후견인 노릇을 한 초(楚)나라 오자서(伍子胥)의 친구 요리(要離)는 무적의 검객이었다. 그는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 ‘자객열전’에도 등장하는 당시의 최고 협객이었다.
그는 당시 어떤 사람과 맞서도 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가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하였다.
‘항상 수비하는 자세로 적을 맞이하라! 적을 만나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 그리고 성급한 적의 공격 속에 비어있는 허점을 찾아 불시에 공격한다.’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적에게 보이는 시형법(示形法)의 진수다. 중국 사람들이 ‘난드어후투(難得糊塗)’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철학이 ‘도회지술(韜晦之術)’이다. 도회지술은 세상을 사는 도가(道家) 철학적 지혜다. 도(韜)는 ‘숨긴다.’ ‘칼집에 칼을 집어넣는다.’는 뜻이다. 회(晦)는 그믐이다. 달이 자신의 광채를 감추는 날이기도 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칼집에 집어넣고, 자신이 가진 광채를 숨기며 살아가는 인생철학이 도회지술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水至淸則無魚),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人至察則無徒)’는 속담이 있다.
너무 똑똑한 척 하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지도자는 멍청한 듯해야 사람이 따른다. 직원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따지면 그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지 못한다. 어떤 때는 알고도 모르는 척 자신의 칼날을 감출 필요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직원이 부지런히 준비해서 설명하면 모르는 척 들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장이 하는 말이 뻔히 무슨 의도인지 알아도 모른척해야 할 때가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의 일이다. 정(鄭)나라의 무공(武公)은 이웃 나라인 호(胡)에 대하여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공은 먼저 호나라를 안심시키려고 자신의 딸 중에 한명을 호나라 왕에게 시집보냈다.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호나라를 침략하여 자신의 나라와 합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조정 중신회의에서 이렇게 물었다. ‘과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이때 관기사(關其思)란 신하기 왕의 의도를 꿰뚫고 호나라를 먼저 공격하여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왕은 내심 자신의 의도가 드러난 것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신하는 과인에게 사돈 나라를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소. 호나라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이거늘 싸움을 부추기는 저 관기사의 목을 베라!’ 관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호나라는 안심하였고, 그 틈을 타서 정나라는 호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켜 버렸다. 관기사는 왕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모른 척 감출 수 있는 지혜는 없었던 것이었다. 때로는 안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침묵이 더욱 값질 때가 있다.
침묵과 관련한 이런 시가 있다.
“사람을 만나서 30%만 말하라(逢人且說三分話)! 내 마음 한 조각 모두 보여주지는 말아라(未可全抛一片心)! 호랑이 세 번 입 벌리는 것은 두렵지 않다(不?虎生三個口). 인간의 수시로 변하는 두 마음이 더욱 두렵구나(只恐人情兩樣心).”
정보는 생명이다.
내가 방심하여 말한 정보가 결국 조직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내가 공격하여 싸우려는 곳을 적이 모르게 해야 한다. 적이 몰라야 지켜야 할 곳이 많게 된다. 적이 지켜야 할 곳이 많아야 내가 맞이해서 싸울 적이 적게 된다.’ 이 평범한 손자병법의 논리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는 윤리학자가 아니다. 조직을 망하게 하고 직원들을 거리로 내모는 지도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 상대방의 허(虛)를 찾아야 한다.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하여 상대방을 안심시켜야 한다.
“상대방의 의도와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나의 의도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形人而我無形).” 손자의 이 명언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다차원지구 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