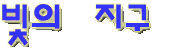지혜의 소리
글 수 1,249
쓸데없는 개념화 작업을 멈춘다면 그대는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것, 항상 그대 안에 있어 온 '그것'이 될 것이다. 진실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부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심부에서는 '보는 자'마저 사라진다.
단 하나의 궁극적인 이해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는 자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자신의 본질과 맞닿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 본질 안에서 그대는 바로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구도자는 "나는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찾아헤매던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이미 집에 당도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관념이란 기껏해야 다른 관념을 부정하는데 유용할 뿐이다. 이것은 가시를 빼기 위해 다른 가시를 사용한 다음 버리는 것과 같다.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만 관념을 버릴 수 있다. 언어란 관념을 다룰뿐이므로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순수한 각성과 '의식안에 투영된 자각' 사이에는 마음이 건너갈 수 없는 큰 틈이 있다. 이슬 방울에 비친 태양이 본래의 태양 자체는 아니다.
개념화 작업을 멈춘다는 것은 사물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즉 비대상적인 인식을 말한다. 이것은 선택과 판단없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우주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는 그대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바로 '그것'이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지금도 존재하며 항상 존재해왔던 잠재성을 자각하고 그 자각 안에서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형상의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이지만 무수한 형상의 근저에는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타자(他者)'라는 개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지혜의 차원에 이른 사람은 에고를 사용하는 듯 보이겠지만 에고가 없다. 그의 빈 마음은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의지 작용의 밖으로 나와 있다. 그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대의 인식이 현상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않는 한 마음 속의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상적 차원을 넘어선 인식은 그대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오는 것이다.
(라메쉬 발세카르)
단 하나의 궁극적인 이해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는 자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자신의 본질과 맞닿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 본질 안에서 그대는 바로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구도자는 "나는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찾아헤매던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이미 집에 당도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관념이란 기껏해야 다른 관념을 부정하는데 유용할 뿐이다. 이것은 가시를 빼기 위해 다른 가시를 사용한 다음 버리는 것과 같다.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만 관념을 버릴 수 있다. 언어란 관념을 다룰뿐이므로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순수한 각성과 '의식안에 투영된 자각' 사이에는 마음이 건너갈 수 없는 큰 틈이 있다. 이슬 방울에 비친 태양이 본래의 태양 자체는 아니다.
개념화 작업을 멈춘다는 것은 사물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즉 비대상적인 인식을 말한다. 이것은 선택과 판단없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우주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는 그대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바로 '그것'이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지금도 존재하며 항상 존재해왔던 잠재성을 자각하고 그 자각 안에서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형상의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이지만 무수한 형상의 근저에는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타자(他者)'라는 개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지혜의 차원에 이른 사람은 에고를 사용하는 듯 보이겠지만 에고가 없다. 그의 빈 마음은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의지 작용의 밖으로 나와 있다. 그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대의 인식이 현상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않는 한 마음 속의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상적 차원을 넘어선 인식은 그대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오는 것이다.
(라메쉬 발세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