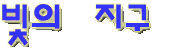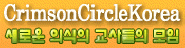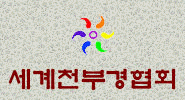지혜의 소리
글 수 1,249
[문화] “문학은 毒龍에서 구해내야 할 공주” (2002.08.06)
▲사진설명 : 박상륭의 아파트 거실에는 그를 알아줬던 지기(知己),고(故)김현이 직접 그려 선물했던 시화(詩畵)가 붙어있다.이번에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다고 한다./허영한기자
박상륭(朴常隆·62)은 우리 문학의 ‘이중장부’다. 신화와 종교를 바탕에 깔고 심오한 사유를 펼친 그의 장편 ‘죽음의 한 연구’와 ‘칠조어론’은 그간의 한국 문학이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땅이었다는 데 많은 평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그 웅장한 성채의 그늘에는 독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대중의 우울한 고백 일반인의 폐활량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길고 긴 문장 따라서 극소수의 독자들에게만 숭배의 대상이 된 현실이 함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생존작가로서는 유례없었던 99년 예술의전당의 ‘박상륭 문학제’, 평론가 김현이 “이광수의 ‘무정’이후 가장 잘 쓰인 작품”이라고 격찬했던 ‘죽음의 한 연구’, 심지어 ‘박상륭 교도(敎徒)’라고까지 불리우는 일군의 독자들의 존재는 그에게 쏟아진 갈채의 한 방증(傍證)이다. 하지만 그는 진정 이해받으며 찬양의 대상이 된 걸까? 3년만에 소설집 ‘잠의 열매를 매단 나무는 뿌리로 꿈을 꾼다’(문학동네)로 돌아온 그에게 뒤틀린 질문을 던져봤다.
―이해받지 못하면서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우람한 산이 저기 있다면 우리가 그 산을 직접 건너지 않더라도 그 산의 웅장함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한다. 질투심때문에 폄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높여 버리거나. 주로 죽은 사람일 경우에 예우로 높이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내가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면 한국에 거의 살지 않아서 내 실물성이 휘발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30년간의 캐나다 이민생활을 마치고 지난 99년 귀국했다. “도저히 문학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한국을 떠날 때, 김현, 박태순, 이문구 등이 공항에서 그를 배웅했다.
―당신의 마니아들은 ‘박상륭 교도’라고까지 불린다. 하지만 그런 열광과는 별도로 당신의 문학이 한국 문학사 속에 제대로 편입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김윤식 교수가 내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왼 손가락에 낀 보석’이라고. 문학에 ‘정종’(正宗)이 있다면 ‘밀종’(密宗)이라는 뜻이겠지. 감히 교만을 부려보건대, 한국 문학사에서 박모(朴某)의 문학 같은 예는 없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캐나다에서 귀국하기 전까지 내 작품을 비평했던 평론가는 거의 없었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자신이 캐나다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서 생산되는 기존의 “비슷비슷한 문학”을 따라 하면서, 표현이나 좀 다듬는 걸로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했다.
―당신의 문장은 너무 길고, 쉼표와 복문(複文)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내 문장 속에는 운율이 있다. 죽은 김 현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냈다. 눈으로 읽는 문장만 있는 게 아니다. 소리를 낼 때 마음 속으로 박자 맞춰 이해되는 문장도 있는 것이다. 쉼표는 운율에 맞춰 쉬라는 뜻이다. 토씨와 쉼표가 한국어를 고급하게도,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는 “문학도 예술이라면 문장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저널리즘의 문장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학의 문장은 그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책의 제목이 ‘잠의 열매를 매단 나무는 뿌리로 꿈을 꾼다’인데.
“사실 전도(顚倒)된 제목이지. 원래는 뿌리로 잠을 자고, 열매가 꿈을 꾸는 것 아니겠는가.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바슐라르가 얘기했듯 세상이 나를 꿈꾸는지, 내가 세상을 꿈꾸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결국 내 꿈 이야기이기도 하겠고.”
―이번 책은 상대적으로 읽기 편해졌다는 견해도 있다.
“이삭줍기 아니냐.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죽음의 한 연구’와 ‘칠조어론’으로 다 끝났다. 수확은 다 끝나고 이제 이삭줍기를 하는 시간인거지. 환갑 넘은 늙은네가 연애소설을 쓰겠나, 추리소설을 쓰겠나. 이제 바위를 쥐어 짜 기름 몇 방울을 뽑아낼 뿐이지. 내 작품에 주석을 달다 보니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 쉬워 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문학은 “독룡(毒龍)에게서 구해내야할 공주”(‘잠의…’·249쪽)다. ‘독룡’은 결국 이 시대를 혼탁하게 만드는 대중문화인 것. 누구의 눈높이에도 맞출 생각은 없다. 그에게 소설쓰기는 ‘앓음다운’ 것이고, 고통스럽더라도 독자들의 독서가 ‘앓음답기’ 바란다. 종국에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니까.
(魚秀雄기자 jan10@chosun.com )
●박상륭
1940년 전북 장수 출생. 서라벌 예대 졸업, 경희대 정외과 수학. 1963년 ‘사상계’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 1969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서점 운영. 1999년 김동리 문학상 수상.
▲사진설명 : 박상륭의 아파트 거실에는 그를 알아줬던 지기(知己),고(故)김현이 직접 그려 선물했던 시화(詩畵)가 붙어있다.이번에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다고 한다./허영한기자
박상륭(朴常隆·62)은 우리 문학의 ‘이중장부’다. 신화와 종교를 바탕에 깔고 심오한 사유를 펼친 그의 장편 ‘죽음의 한 연구’와 ‘칠조어론’은 그간의 한국 문학이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땅이었다는 데 많은 평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그 웅장한 성채의 그늘에는 독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대중의 우울한 고백 일반인의 폐활량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길고 긴 문장 따라서 극소수의 독자들에게만 숭배의 대상이 된 현실이 함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생존작가로서는 유례없었던 99년 예술의전당의 ‘박상륭 문학제’, 평론가 김현이 “이광수의 ‘무정’이후 가장 잘 쓰인 작품”이라고 격찬했던 ‘죽음의 한 연구’, 심지어 ‘박상륭 교도(敎徒)’라고까지 불리우는 일군의 독자들의 존재는 그에게 쏟아진 갈채의 한 방증(傍證)이다. 하지만 그는 진정 이해받으며 찬양의 대상이 된 걸까? 3년만에 소설집 ‘잠의 열매를 매단 나무는 뿌리로 꿈을 꾼다’(문학동네)로 돌아온 그에게 뒤틀린 질문을 던져봤다.
―이해받지 못하면서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우람한 산이 저기 있다면 우리가 그 산을 직접 건너지 않더라도 그 산의 웅장함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한다. 질투심때문에 폄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높여 버리거나. 주로 죽은 사람일 경우에 예우로 높이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내가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면 한국에 거의 살지 않아서 내 실물성이 휘발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30년간의 캐나다 이민생활을 마치고 지난 99년 귀국했다. “도저히 문학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한국을 떠날 때, 김현, 박태순, 이문구 등이 공항에서 그를 배웅했다.
―당신의 마니아들은 ‘박상륭 교도’라고까지 불린다. 하지만 그런 열광과는 별도로 당신의 문학이 한국 문학사 속에 제대로 편입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김윤식 교수가 내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왼 손가락에 낀 보석’이라고. 문학에 ‘정종’(正宗)이 있다면 ‘밀종’(密宗)이라는 뜻이겠지. 감히 교만을 부려보건대, 한국 문학사에서 박모(朴某)의 문학 같은 예는 없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캐나다에서 귀국하기 전까지 내 작품을 비평했던 평론가는 거의 없었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자신이 캐나다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서 생산되는 기존의 “비슷비슷한 문학”을 따라 하면서, 표현이나 좀 다듬는 걸로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했다.
―당신의 문장은 너무 길고, 쉼표와 복문(複文)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내 문장 속에는 운율이 있다. 죽은 김 현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냈다. 눈으로 읽는 문장만 있는 게 아니다. 소리를 낼 때 마음 속으로 박자 맞춰 이해되는 문장도 있는 것이다. 쉼표는 운율에 맞춰 쉬라는 뜻이다. 토씨와 쉼표가 한국어를 고급하게도,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는 “문학도 예술이라면 문장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저널리즘의 문장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학의 문장은 그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책의 제목이 ‘잠의 열매를 매단 나무는 뿌리로 꿈을 꾼다’인데.
“사실 전도(顚倒)된 제목이지. 원래는 뿌리로 잠을 자고, 열매가 꿈을 꾸는 것 아니겠는가.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바슐라르가 얘기했듯 세상이 나를 꿈꾸는지, 내가 세상을 꿈꾸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결국 내 꿈 이야기이기도 하겠고.”
―이번 책은 상대적으로 읽기 편해졌다는 견해도 있다.
“이삭줍기 아니냐.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죽음의 한 연구’와 ‘칠조어론’으로 다 끝났다. 수확은 다 끝나고 이제 이삭줍기를 하는 시간인거지. 환갑 넘은 늙은네가 연애소설을 쓰겠나, 추리소설을 쓰겠나. 이제 바위를 쥐어 짜 기름 몇 방울을 뽑아낼 뿐이지. 내 작품에 주석을 달다 보니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 쉬워 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문학은 “독룡(毒龍)에게서 구해내야할 공주”(‘잠의…’·249쪽)다. ‘독룡’은 결국 이 시대를 혼탁하게 만드는 대중문화인 것. 누구의 눈높이에도 맞출 생각은 없다. 그에게 소설쓰기는 ‘앓음다운’ 것이고, 고통스럽더라도 독자들의 독서가 ‘앓음답기’ 바란다. 종국에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니까.
(魚秀雄기자 jan10@chosun.com )
●박상륭
1940년 전북 장수 출생. 서라벌 예대 졸업, 경희대 정외과 수학. 1963년 ‘사상계’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 1969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서점 운영. 1999년 김동리 문학상 수상.